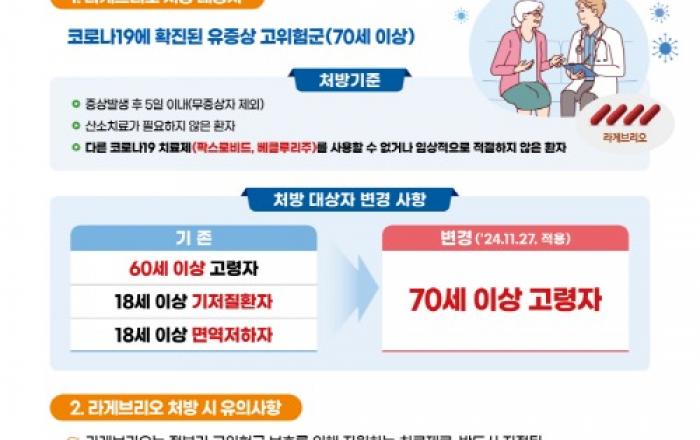“대체 뭐가 문제야” 美선 잘나가는데 국내서 맥못춘 ‘이것’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유럽 등에선 선전하는 사이 국내에선 고용 인원과 시장 규모가 모두 뒷걸음질쳤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주요 원인으로 지난 3년 사이 5곳의 대기업이 일부 또는 전체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태양광 생태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2015년 8639명이던 태양광 제조업 고용인원은 2021년 6654명까지 줄었다. 국내 태양광 제조업의 내수시장 규모도 2015년 2조2896억원에서 2021년 2조1695억원으로 축소됐다.
원인은 중국산 태양광의 저가 공세다. 국내 대표 태양광 관련 기업 중 한 곳인 OCI는 지난 2020년 태양광 셀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국내 생산을 멈췄다. 폴리실리콘은 생산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채산성을 좌우하는데,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월등히 싼 중국산이 밀고 들어오자 사업을 접었다. 같은 해 한화솔루션도 폴리실리콘의 국내 생산을 접었다. 같은해 4월에는 태양광 모듈에 쓰이는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트 사업을 SKC가 접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용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하던 웅진에너지가 파산을 선고받았다. 중국산 저가공세에 밀려 적자에 시달리다 2020년 법정관리에 돌입한 뒤 2년 만에 상장폐지와 파산까지 겪었다. LG전자도 지난해 6월 태양광 모듈 사업을 접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태양광의 국내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국내 태양광 셀 시장의 52%를 점유하던 중국산은 2022년 59%까지 점유율이 높아졌다. 모듈 기준으론 27%에서 32%로 높아졌다. 하지만 중국산 셀을 사서 국내에서 모듈을 만들면 이는 국산으로 분류되다보니, 실제 국내 시장서 유통되는 중국산 비율은 더 높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를 갖추고 연구·개발이나 생산 공정을 이끌려고 해도 미국같은 보조금도 없으니 투자가 망설여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활력이 도는 분위기다. 국내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무하다. 하지만 한화솔루션 큐셀부문과 OCI는 북미에서 직접 이를 생산하며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미국에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은 IRA를 통해 태양광 공장 건설 때 3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제품 생산 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태양광 산업의 자국 밸류체인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늘어도 이를 수출 기회로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NEF는 글로벌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이 올해 236기가와트(GW)에 달할 것이며 2030년에는 334GW까지 늘 것으로 봤다. 이는 원전 334기에 해당하는 설비 규모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견제를 강화하면 전세계서 한국산 태양광에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궤멸한 국내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선 한국에 태양광 제조시설이 설립될 경우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K-IRA)’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민의힘도 분산형 전원 관련 법 등을 통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