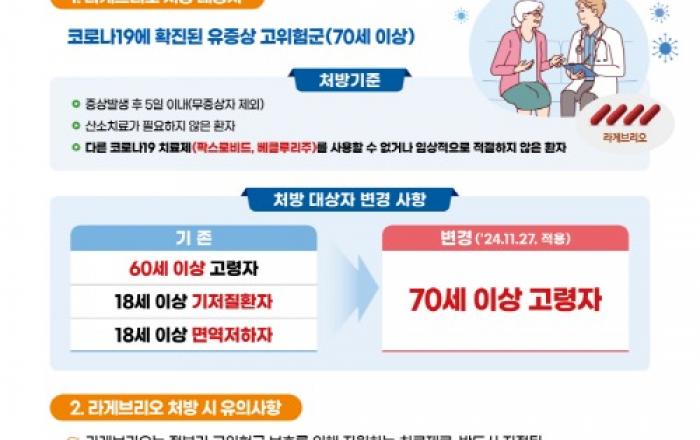'1만원 배달비' 잡는다···정부, 2월부터 배달 수수료 공개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배달 수수료 공시제를 도입해 배달의 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앱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거리 두기 규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비가 최대 1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소비자물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배달 앱 관계자들은 “플랫폼에 소속된 라이더 서비스는 건당 배달비가 5,000원 선을 넘기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입점 업주가 배달 대행 서비스를 쓰면서 배달비를 올려 받으면 통제할 명분이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단체들의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비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배달비를 직접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통한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단체들은 배달 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해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 주문 금액 제한 등 주문 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배달비 인상 논란은 배달대행업체에서 불거졌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 배달 기사를 뺏길 것을 염려해 배달 수수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10년 전 3000원이었던 기본 배달료는 4000원대로 올랐다. 기상 할증은 100~300원에서 500원으로, 거리 할증 요금도 비싸지는 추세다. 이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 인상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배달비 논란이 거세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배달 수수료를 규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배달 수수료는 배달 기사 ‘수익’과 직결돼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가 내야하는 배달비가 오르는 것은 배달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며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배달비 공시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배달비는 배달플랫폼, 배달대행업체, 자영업자, 배달 기사 등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며 “배달비 공개는 소비자 관점에서 배달비를 바라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